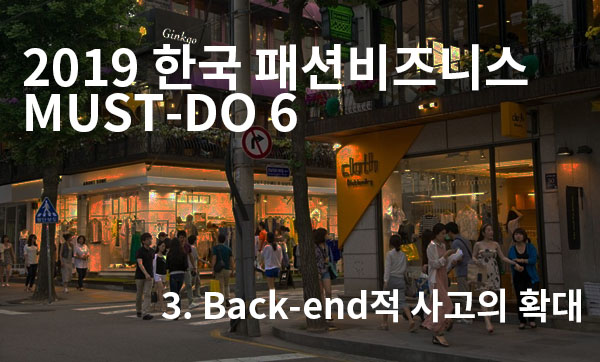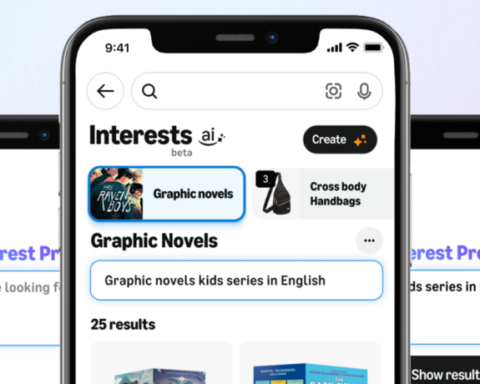이 글은 공개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 패션넷코리아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2019년 한국 패션비즈니스가 ‘반드시 해야할’ 6가지를 담았어요. 하루에 1개씩 소개할까 해요. 6가지를 한 번에 보시려면, 패션넷코리아 전문 링크,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3. Back-end적 사고의 확대
90년대를 풍미했던 감성위주의 패션비즈니스는 한 가지 큰 시대착오적인 습관을 우리에게 남겼다. 컨셉과 이미지, 분위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파악하는 Front-end적인 사고가 그것이다.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섰을 때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가,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길 바라는가,란 질문이야말로 과거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였다.
이 질문에 치열하게 대답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도 무척 많다. 의류제품에 대한 섬세한 마감이나 매장인테리어, VMD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의 퀄리티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봐도 매우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시대가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런 Front-end적인 비즈니스 방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매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소비자다. 브랜드가 준비한 모든 메시지를 매장에 심어두는 데 익숙한 패션기업들에게, 어느 날 부터 매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소비자는 생각지 못한 문제였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검색한다. 또 매장을 찾는다 할지라도, 찾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품을 검색해보고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의 82%가 매장을 찾기 전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했다. 이 비중은 더욱 커져서 2017년에는 무려 91%의 소비자가 온라인 검색 후 매장을 찾고 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다. 이제 기업은 온라인이란 낯선 공간에서 소비자를 만나야 한다.
온라인은 오프라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오프라인은 목이 좋은 곳에 점포가 들어서면 고객의 유입은 Organic하게 늘어나지만 온라인에는 ‘목이 좋은 곳’이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의 유입은 오가닉하지 않다. 이 공간에서는 고객 하나를 끌어오는 데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가 관건일 뿐이다.
온라인은 지출과 속도의 싸움이다. 더 많이 지출할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기업은 그렇게 유치한 고객들을 통해 반드시 지출 이상의 구매를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속도’다.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빠르게 발송하고 빠르게 채워넣고 빠르게 홍보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어야 충분한 구매가 일어난다.
다시말해 이 세계는 ‘감성’보다 ‘효율’이 관건이다. 이런 시기에는 Front-end적 사고보다 Back-end적 사고가 중요해진다.
이 변화는 이커머스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SPA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던 시기에 이미 Back-end적 사고의 중요성은 감지되었다.
Zara가 인기를 끌자 한국의 많은 브랜드들이 SPA를 표방했지만, 딱히 성공한 곳은 없다. 속도와 효율이 중요한 SPA 시장에서 Zara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은 효율 위주의 Back-end적 사고에 강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Front-end적으로는 대부분 Zara와 비슷하게 출발했다. 비슷한 크기의 대형매장과 비슷한 SKU의 제품을 마련해 비슷한 소비자가격으로 사업이 출범한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이끌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이다.
Zara의 매장은 글로벌하게 7천개가 넘는다. 7000개 매장을 커버하는 규모를 생산하는 그들의 낮은 원가를, 2-30개 매장 규모의 브랜드가 경쟁력있게 맞출 수 있는가? 생산원가에 혁혁한 차이가 있음에도 소비자가가 비슷하다면, 과연 마진은 브랜드가 성장할 만큼 충분한 것인가?

Back-end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브랜드들에서도 발견된다.
패션사업이 마이너스 성장곡선을 그리면서, 많은 기업들은 넥스트 비즈니스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런칭하기 시작했다. 어떤 크기의 매장에, 어떤 제품들을, 어떤 가격으로 진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Front-end적 작업은 패션기업들에겐 능숙한 문제들이었으므로 제품을 출시하고 첫매장을 오픈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같은 곳에서 발생한다. 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이끌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패션보다 더욱 복잡하다. 더 많은 SKU가 각기 다른 공장과 사입처를 통해 들어온다. 패션은 원단과 봉제공장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굴러가는 비교적 단순한 비즈니스다. 이런 비즈니스는 제품관리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원단이 다르고 공장이 다를지라도, 옷이라는 제품을 관리하는 룰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처럼 가구, 그릇, 인테리어소품처럼 같은 각기 다른 생산공정을 가진 제품을 다루는 비즈니스의 경우는 관리에 큰 비용이 든다.
기업이 직접 각 제품마다 품질 및 디자인관리를 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면 인건비 지출이 높을 것이요, 몸집을 가벼이 가져가기 위해 외주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제품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이 비용을 상쇄시키고 기업이 성장을 도모할 정도로 이익을 내려면, 우선 비즈니스 규모가 그에 상응해야 한다. Franc Franc이나 Muji같은 다품종 모델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일본에는 1억2천이라는 내수 인구덕에 충분히 큰 사업규모를 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내수 인구가 5천에 불과하다. 인구는 시장의 최대 사업규모를 규정하는 법이다.
한국내수만 바라보는 사업일 경우, 핵심 SKU로 압축된 라이프스타일, 혹은 고마진 제품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면, 또는 사입가가 늦은 해외소싱처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Front-end와 비슷한 사업구조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의 BM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쉬이 실패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장규모의 차이에 따른 Back-end최적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유통사들이 저마다 개척하고 있는 PB 브랜드에서도 나타난다. 작은 시장에서 지나친 다양성의 Front-end를 구축하는 것은 누군가는 마진을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양보하지 않으면 공급처가 양보해야 하고 공급처가 양보하지 않으면 원부자재가 양보해야 한다. 결국 이런 구조는 태생적으로 퀄리티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브랜드가 많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던 시절에는 Back-end적 사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시기엔 모든 소비자들의 구매가 몇몇 인기 브랜드로 집중되었다. 즉, 한 브랜드가 성공하면 놀라우리만치 큰 매출이 일어나, 내부적으로 어떤 비효율과 낭비가 있었든지간에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브랜드들이 과다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더 많은 옷이 소비되지만, 브랜드별 매출은 줄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브랜드까지 내수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은 가속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수익을 내려면 다방면에서 치밀한 효율을 담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 가지 다행한 소식은, 다방면에서 그 효율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리테일테크’ 혹은 ‘패션테크’란 이름으로 개발된 모든 기술들의 공통된 목적은 ‘최적화’다.
지금의 테크들은 옷 하나를 생산할 때에도 어느 공장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지, 옷을 분배할 때에도 어느 매장에 몇벌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판매에 유리한지, 심지어는 이 옷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까지도 아주 적은 오차범위로 추론해낸다.
뿐만 아니라 테크놀러지는 경영상의 난점들도 함께 해결해준다. 턴오버가 심한 CS직이나 매장직원들 문제를 해결하는 무인점포 시스템들은 이제 상용화가 머지 않았다. 이것은 무인편의점만의 일은 아니어서, 올 5월 오픈한 Zara의 런던 플래그십에는 상품을 포장하는 로봇 암(Robot Arm)과 자동결제 시스템이 갖추어져 무인매장 직전의 단계에 다다른 패션 리테일의 근미래를 보여주었다.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선을 잡은 리딩 브랜드들은 ‘최적화’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제 테크놀러지를 다룰 줄 알며,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그 기술 도입의 ROI를 계산한다. 이들은 최적화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저 솔루션의 활용으로 얻게 될 베네핏을 비교해, 투자대비 리턴이 충분한가를 고려한 다음 도입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감성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Front-end 기반의 기업들은 기술도입에도 쉬이 실패한다. 선진기업들의 Frond-end를 보고, 그들이 쓰는 기술을 따라 도입해서는 안된다. 나의 구조에는 적합한 시스템인지, 지금이 도입할 시점인지, 저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Back-end에 대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지 않는다면 테크놀러지의 도입은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기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져 가는 추세다. Back-end적 사고에 눈을 뜬 리딩 기업들은 테크놀러지를 다루는데도 점점 익숙해져 가며 테크놀러지로부터 효율과 최적화에 대한 더 첨예한 시각들을 배워나간다. 반대로 아직 Front-end적 사고에 몰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재정은 낭비로 줄줄 새고 있으며, 어쩌다 도입한 테크놀러지 또한 기업에 성과를 돌려주지 못하는 형국을 맞고 있다.
먼저 사고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앞서 Post-Digital 시대의 리더십 요건 중 나라로 팀의 창의성보다는 ‘혁신, 학습, 개선’이란 포커스를 둘 것을 꼽았다. 기업 문화가 혁신과 학습, 개선에 있지 않다면 사고방식의 개선은 불가능하며, 사고방식이 Back-end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효율’이란 숙제를 달성하게 될 확률은 요원하다.
[Zozotown의 사례]
조조타운은 ‘조조수트(Zozosuit)’를 런칭하고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가장 먼저 MTM(Made to Measure: 개인맞춤 대량생산)사업에 성공적으로 발을 디딘 사례로 조명받았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는 조조수트를 폐쇄했다.

조조타운이 조조수트를 통해 잰 치수로 커스텀 생산을 하기로 했던 품목은 데님과 티셔츠, 수트였다. 조조수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몇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일단 수트의 배포와 개별 치수를 수집하는 과정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이라는 뒷감당이었다. 조조타운은 주문량만큼 생산해내지 못했다. 지난 3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15.4억엔의 수트를 주문받았지만, 그 중 5억엔어치만 배송할 수 있었다. 조조타운은 MTM 사업을 기획할 때, 소비자 입장의 프로세스는 정확히 기획했지만, Back-end, 즉, 뒤에서 일어나는 생산시스템을 세심히 준비하지 못했다.